임차인이 일시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했을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 자신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임차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을 퇴거했다가 재진입할 때는 종전 대항력은 상실하게 된다. 재전입 다음 날 0시의 효력발생일과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에 따라 대항력의 유무를 다시 가리게 된다. 전입세대 열람표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선순위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후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자 소유 검문에 임차인이 있는지에 대해 실사한다. 선순위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 후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소유자는 은행에서 감정이 나오면,
"별일 아니니 임차인이냐고 물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해주자니 건물주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해주자니 찜찜하지만 부탁을 들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다행히 이런 물건이 별일 없으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사이가 원만하겠지만, 문제는 건물이 경매로 나오면 임차인의 입장은 어찌 되겠는가? 전입 일자가 빠른 선순위임차인 경우 그야말로 건물주의 편의를 봐주려다 쪽박 신세가 된다.
법원에 배당요구도 허용이 안 되고(대판 1997.06.27 선고 97다1221)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대판 2016.12.01. 2016다228215,대법 2017.04.07선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대항력 있는 물건이라 해서 접을 것이 아니라, 무상거주확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입찰에 참여해 볼 만하겠다.
건물과 대지에 말소기준 권리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의 적용기준은?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중에 설정 일자가 빠른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매각 물건의 경우에 토지만 매각할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권만 인정해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은 토지 매각분에서 배당요구만 가능하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로 변한 경우에 대해
주택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임차인으로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대항요건의 구비일이 되고 그다음 날 오전 0시가 대항력 효력 발생일이 된다(대법 2001다61500).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대항력이 없던 종전 임차인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 2002다38361).
재경매 시의 대항력은
선순위임차인이 제1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 제2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낙찰자에게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 2005다21166).
대항력 존속기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갖기 위한 취득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다음 날 이사를 하여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인정한다. 그런다 해도 배당요구 신청만 해놓고 이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데도 급한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된 상태에서
경매가 취소되어 재경매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부득불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를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제를 통해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뭔 말이래."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한 푼도 못 받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말짱 꽝이네."
그렇다. 아직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다.
경매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우선변제권의 권리로 얼마나 많이 보증금을 반환받을까? 실제 경매에서 그나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은 전체 임차인 중에 약 10% 내외로 평하고 있고, 최근 어느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무려 4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경매에서 임차인도 힘들고, 입찰자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이 되고, 1983년에는 소액보증금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생겼다.
1989년 확정일자가 제정되어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틀을 갖추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2001년에 법 제정과 함께 확정일자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세입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되는 것을 꺼리는 건물주에게 사정해서 설정비용을 지불해가며 전세권 등기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겨우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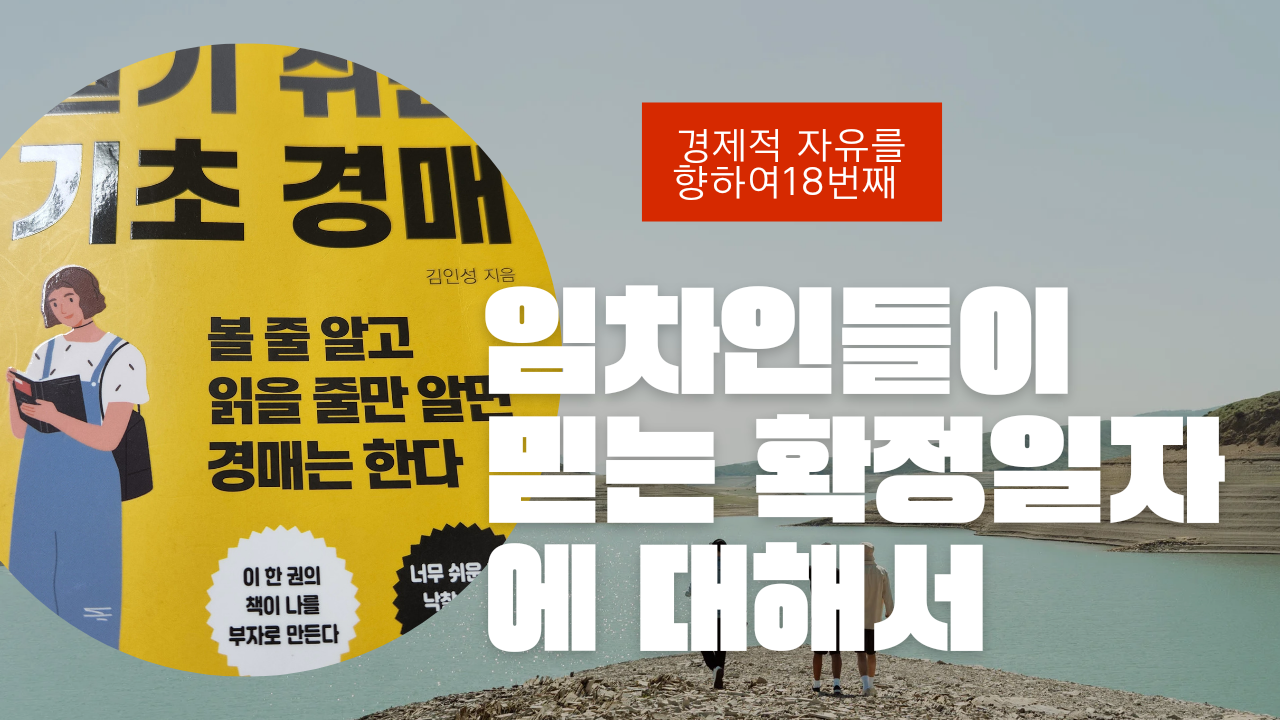
'경매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에서 배당이란? (1) | 2022.07.27 |
|---|---|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 | 2022.07.27 |
|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요건과 대항력 배우기 (1) | 2022.07.25 |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어디까지 인가? (1) | 2022.07.25 |
|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 지위와의 상관관계 (1) | 2022.07.25 |




댓글